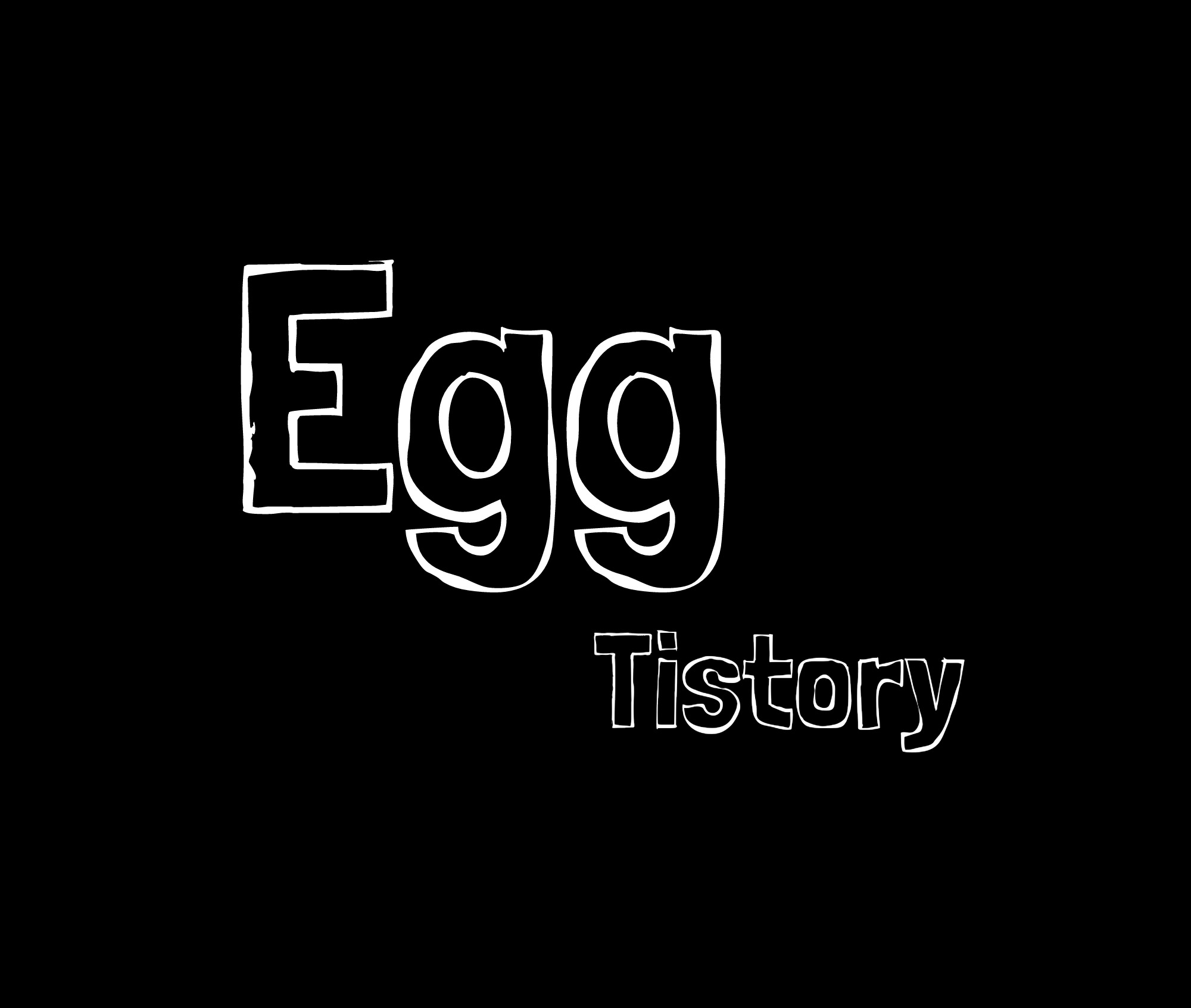소득과 행복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과연 많은 부를 쌓은 만큼 삶에 대해 만족하게 될까? 경제학자들은 잘 사는 이들이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먼드 교수는 '서방 국가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훨씬 더 부유해졌고, 더 많은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건강하게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그만큼 행복해지지는 않았다.'라고 지적한다. 물론 어느 한 시점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보다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시점들을 비고해 보면 부유해지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행복=소득?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반세기 동안 미국인들의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세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매우 행복하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그대로였다. '매우 행복한' 이들은 1950년대 후반 한때 40%를 웃돌기도 했지만 1990년대 말에는 30% 남짓한 수준으로 줄었다. 일본에서도 1인당 소득이 6배로 늘어나는 동안 행복한 이들의 비율은 그대로였으며, 유럽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다른 여러 나라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먹고 살기에 급급한 나라들은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지만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를 넘어선 나라들을 보면 그런 관계가 거의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소득과 행복의 상관 계수는 매우 높다. 하지만 1인당 소득이 1만 3천 달러를 넘어선 나라들 사이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희미해진다. 1인당 소득이 1만 5천달러를 넘는 나라들을 보면 행복은 소득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 위기 이후 12년 동안 한국인의 1인당 소득(원화 기준)은 꼭 두 배로 늘어났지만 한국인들은 소득이 늘어난 만큼 행복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의 사회 심리학자 애드리언 와이트가 2006년 발표한 나라별 행복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102위에 머물렀다.
이스털린의 역설과 그 원인

더 부유해진 이들이 더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을 이스털린 역설(Easterline Paradox)이라고 한다. 레이어드는 이처럼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 까닭은 부의 습관화와 부를 향한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노동의 열매가 주는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옛날 같으면 꿈도 꾸지 못했을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사람들은 금세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풍요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기대 수준은 급속히 높아진다.
갈수록 격력해지는 경쟁도 행복 지수를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사람들은 지난날보다 잘살게 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가장 좋은 집과 가장 비싼 자동차를 가질 수 없으며 이렇게 지위를 과시하는 재화들은 다른 많은 이들이 가질 수 없는 희소성과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잘살고 싶은 열망을 품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린다. 문제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경쟁은 치열한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결국 행복 지수를 떨어트리게 된다.
행복을 탐구하는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소득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소득의 높낮이만 따지면 일 자체에서 성취감을 찾기 어렵고, 더 많은 소득과 소비, 더 높은 지위만 추구할 때 가족과 건강 그리고 여가의 소중함을 잊게 된다는 점도 일깨운다. 따라서 행복 경제학자들은 직업의 안정성, 공동체 의식 정신적 건강, 정치적 개인적 자유를 비롯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소홀히 다룬 가치들을 다시 성찰하게 해 준다.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한 삶을 위한 돈은 벌어야 한다. 하지만 돈이 굴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학문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등 학생도 이해 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 (0) | 2020.09.09 |
|---|---|
| #1)거시 경제학과 미시 경제학 (경제학 기초) (0) | 2020.09.08 |
| #0)경제학의 개념은 무엇인가 (0) | 2020.09.08 |
| 경제적 인센티브 방법에 대한 고찰(폐수 배출 부과금과 탄소 배출권) (0) | 2020.09.08 |
댓글,